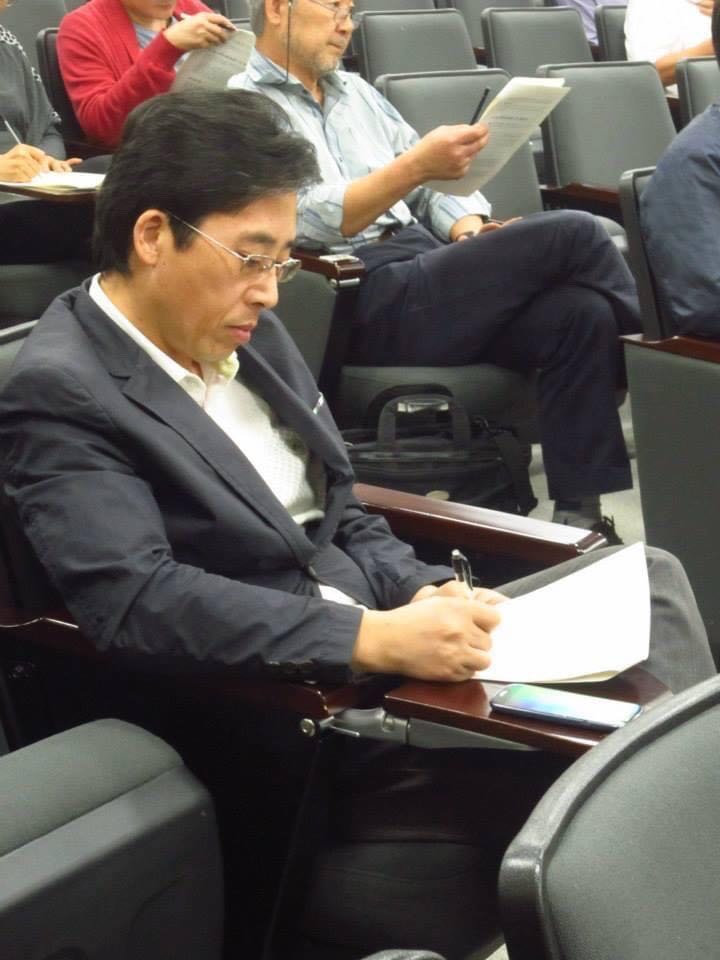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6K2FDD
- 당일치기여행
- #가평군
- 청평면
- 산책길
- 가평 가볼만한 곳
- 꿈의동산
- 숭덕전제례무형문화재
- 가평꿈의동산
- 여행스케치
- 6K2BDP
- #상천리
- 숭덕전참봉
- 6K2ELK
- CQ쟁이
- 가평당일치기
- 에덴벚꽃길
- #가평여행
- 박씨시조대왕
- 신라시조대왕
- 남도여행
- 가평군
- 6K2CPL
- 6K2CPV
- 가평여행
- 밀성박씨
- 6K0IK
- 6K2CRE
- 가평 꿈의동산
- 꿈의동산 놀이공원
- Today
- Total
cq쟁이
신라의 건국신화와 제의 본문
신라의 건국신화와 제의
최 광 식 (고려대학교 교수)
Ⅰ. 머리말
신라의 신화로는 박혁거세 신화.석탈해 신화․김알지 신화 등이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등의 사서에 실려 전하고 있다. 박혁거세 신화는 시조신화이면서 건국신화이기도 하며, 석탈해 신화와 김알지 신화는 시조신화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 박․석․김 신라 3성의 시조신화는 국가형성기 신라사회의 모습과 上古 신라인의 관습, 신앙 및 종교의 한 단면을 전해 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신라의 시조신화들은 다양한 계통의 신화 요소가 뒤섞여 있어 초창기 신라사화와 문화가 지녔던 복잡한 중층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신화가 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 이론적 구조라고 한다면, 제의는 신앙의 실천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양자는 깊이 얽혀 유기적으로 전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고대사회는 어느 시대보다도 종교에 대한 관심이 컸으며, 종교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더구나 권력자가 등장하고 정치체가 형성되면서 종교는 권력자의 정당성과 지배의 이데올로기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신라에서도 天神, 始祖神, 地神 관념으로 대표되는 토착신앙이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 정치적․사상적․종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글에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문헌에 나타난 신라의 건국신화와 시조신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始祖廟와 神宮을 중심으로 신라인들의 신앙과 사회상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Ⅱ. 신라의 건국신화와 시조신화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이지만, 인간들이 자기들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 낸 이야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신화는 나름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라의 신화 역시도 신라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건국신화는 역사성이 농후하며 동시에 사회반영이 높은 상징적 측면과 역사적 측면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신화해석과 함께 사회생활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하고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
종래 신라의 신화를 식민사학의 영향으로 단지 허황된 이야기거나 원시적인 신앙과 관련시켜 이해한 적도 있었다. 또한 천강신화와 난생신화를 가지고 북방문화와 남방문화를 나누는 도식적인 이해를 위한 자료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또는 일률적으로 천신족과 지신족의 결합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고고학적 발굴성과와 인류학의 도입으로 고대사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전개되면서 건국신화를 국가형성과 관련시켜 보기 시작하였다. 물론 신화의 내용 모두를 긍정하고 신빙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반영으로서 이해하자는 것이다. 신화의 구조와 내용을 역사적 사실과 관련시켜 신라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신라문화의 특성까지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박혁거세의 신화는 천강신화와 난생신화가 결합되어 있으며, 그 신이한 등장을 말이 알려 주고 있다. 또한 혁거세의 신이함은 알영의 신이한 탄생과 신성혼이 더욱 보강해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알영의 탄생은 용·우물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과의 관련을 의미하며, 결국 농경과 깊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혁거세는 사후 다음 왕인 남해왕대에 시조묘에 모셔져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숭배되었다.
석탈해의 신화는 해양세력과 관련이 있으며 역시 난생신화이다. 혁거세 신화에서는 알을 갈라 사내아이를 얻은 반면, 탈해 신화에서는 처음에 보냈을 때는 알이었는데 해변에서 阿珍義先이 발견했을 때는 사내아이가 되어 있었다. 탈해는 바다를 표류하면서 알에서 胎로 변화한 것이다. 그 바다는 바로 양수로서의 의미가 있다. 탈해가 冶匠이라고 한 것은 거짓 꾀를 낸 것이었을 뿐이며, 탈해의 활동영역을 보면 동해안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사후에 토함산의 산신이 되어 동악신으로 숭배되었고, 中祀로서 국가제사가 고려시대까지도 이어졌다.
김알지 신화는 천강신화와 난생신화가 복합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김알지는 胎生이었다. 그가 금함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을 뿐 알에서 나왔다는 기록은 없다. 알지의 신화는 매우 인간적이며 사실적이다. 석탈해의 신화와 마찬가지로 호공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세력과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알지의 탄생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그가 태어난 곳이 금함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알지 신화에서 중요한 의미는 발달한 철기와 제련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북방세력의 진출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알지 신화의 사실성은 世系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신화로서는 후대적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혁거세 신화·석탈해 신화·김알지 신화는 각기 시대적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혁거세 신화는 농경생활, 석탈해 신화는 해양활동, 김알지 신화는 발달한 제철기술을 반영하고 있으며 각 신화는 시기적 발전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여러 계통의 신화가 나타나는 것은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볼 수 없는 신라만의 특징이다. 이러한 여러 계통의 신화가 남아 있는 것은 신라문화의 복합성과 중층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라문화의 다양성과 융합성을 엿볼 수 있다.
Ⅲ. 시조묘와 시조묘제사
신라의 시조묘는 제2대 남해왕대에 처음 설치되었다. ?三國史記? 祭祀志에는 신라의 시조묘가 시조 박혁거세의 廟라고 하여, 신라의 始祖神이 박혁거세임을 명기하고 있다. 아울러 1년에 四時로 제사지냈으며, 이를 누이에게 주제토록 하였다는 사실도 함께 기재해 두었다. 이후 신라는 제8대 아달라왕대에 시조묘를 중수하였고, 제21대 소지왕대에 이르면 수묘 20가를 증치하기도 하였다.
이때 수묘 20가를 증치한 데 대한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잘 알 수 없다. 다만 수묘 20가를 증치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전에도 守廟家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守廟’가 ‘守墓’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음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王廟를 王陵으로 인식한 것은 味鄒王陵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是以邦人懷德 與三山同祀而不墜 躋秩于五陵之上 稱大廟云
미추왕릉을 大祀인 三山과 같은 격으로 제사지내고 이를 五陵의 위에 놓으며 大廟라 칭하였다. 이를 통해 미추왕릉은 대묘이며, 오릉은 시조묘임을 알 수 있다. 즉, 시조묘는 오릉이었던 것이다. 上代人들이 오릉의 무덤 자체를 시조묘로 하였는지, 아니면 오릉 근처에 따로 건물을 지어 시조묘로 삼았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등장하는 시조묘 제사 기록을 살펴보면, 시조묘의 명칭과 제사의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廟의 명칭에 있어서는 始祖廟 이외에 祖廟, 國祖廟, 廟, 先祖廟, 祖考廟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신라의 시조묘에 모셔진 박혁거세는 박씨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신라의 국조로 받들어 졌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 때문에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사 관련 기록에는 시조묘 이외에 조묘나 국조묘라는 명칭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시조묘에 왕이 친히 제사지냈다고 되어 있고, ?삼국사기? 제사지에서는 누이인 아노로서 四時로 제사를 주제하게 했다고 하였다. 사시란 계절마다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는 의미이니 일년에 네 번씩 지냈다는 것이며, 이때의 제사는 아노가 주제한 것이다. 즉, 계절마다 지내는 통상적인 의례는 아노와 같은 祭官이 주제하고, 즉위의례 등 중요한 경우에는 왕이 친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왕이 친사한 경우에도 제관인 아노는 제사에 관여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한다면 왕은 祭主였고, 아노는 祭官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왕은 제주로서 제사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아노와 같은 제관은 이미 왕의 직속하에 제의의 기능적인 면을 담당하는 데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조묘에 대한 제사의례는 어떠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의의는 무엇이었을까? 계급사회로 들어서면서 지배자는 여러 신들 중에서 천신에 대한 제사의례를 통하여 지배권을 확립하려 했다. 여러 신들의 서열화 과정 속에서 천신이 정점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가형성이 본격화되면서 지배자는 하늘의 자손이라는 의식을 강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신라에서는 천강신화를 가진 박혁거세를 위한 시조묘를 세우고, 이에 대한 제사를 통하여 왕권강화를 꾀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의를 내적인 지배이데올로기로서 활용하는 동시에, 나아가 주변세력을 정복하는 배타적 지배이데올로기로써 확립시킨 것이다.
시조묘제사는 고대국가 형성의 가장 중요한 징표 중 하나로, ?三國志? 韓傳에 보이는 大國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小國에서의 천신에 대한 제의가 마침내 대국에서는 천의 자손에 대한 제의로 발전된 양상이다. 여기에 시조묘제사가 갖는 정치사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Ⅳ. 신궁의 설치와 나정
신라 神宮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소지왕 9년(487)조에 보이는 시조탄강지인 奈乙에 신궁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다. 소지왕 7년(485) 4월 시조묘에 수묘 20가를 증치하고 나서 2년 뒤인 9년 2월에 신궁을 설치하였으며, 신궁을 설치하고 난 다음 해 정월에 왕이 月城으로 移宮하였으므로 이는 매우 의도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신궁을 설치한 다음 해에 內殿 焚修僧과 宮主와의 간통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토착신앙과 불교와의 사상적 갈등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사건의 시기가 소지왕 10년이라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이 시기는 처음 나을에 신궁을 설치하고 난 9년 2월의 바로 다음 해이다. 즉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 天地神을 모신 신궁을 설치하였으나 다음 해에 불교와의 사상적 갈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여기에서 내전의 분수승을 죽임으로써 사건을 일단락 짓게 되는데, 이것은 아직 자체적으로 사상적 통일을 기하지 못한 과도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지왕 17년 정월에 왕이 친히 신궁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삼국사기? 제사지에는 신라의 신궁이 제22대 지증왕대에 설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는 소지왕대에 처음으로 설치하여 친히 제사를 행하였으나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가 지증왕대부터 비로서 제도화된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신궁의 설치 이후 신라에서는 시조묘에 대해서 이루어지던 제사가 신궁에 대한 제사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러나 신궁이 설치되고 나서 시조묘가 없어졌다는 기록은 없으며, 제40대 애장왕대, 제41대 헌덕왕대, 제42대 흥덕왕대에는 시조묘에 왕이 배알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즉, 신궁이 설치된 이후에도 시조묘는 계속 존치되어 있었으며, 다만 국가제사의 중심만이 바뀌게 된 것이다.
?삼국사기? 제사지를 살펴보면 신라의 제사제도는 시조묘에서 오묘로, 신궁에서 사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라본기를 보면 오묘나 사직이 설치된 이후에도 시조묘와 신궁의 제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시조묘에서 오묘로, 신궁에서 사직으로 변화했다고 한 것은 제사지를 분석한 내용으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도상 그러했다는 것이다. 신라본기에 의하면 통일기 이후에도 시조묘와 신궁에 대한 제사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것은 신라문화의 특징으로 제도와 실제가 다른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제도상으로는 중국을 의식하여 시조묘 대신 오묘로, 신궁 대신 사직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졌지만 신라는 자신들의 독자적 제사인 시조묘와 신궁에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한편, 경주 나정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4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우물지, 원형건물지, 팔각건물지 등이 확인·보고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팔각건물지의 발굴로 인해 나정과 신궁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 나정은 낮은 평지성 구릉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경주 남산의 서쪽 자락에 해당한다. 주변에는 五陵을 비롯해 창림사지, 금광사지 등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우물 주변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으며 발굴 전에는 후대에 설치된 담장이 둘러져 있었다.
2002년 1차 조사에서 팔각건물지가 조사되고 2차 조사에서는 팔각건물지를 둘러싼 담장지와 청동기시대 주거지 2동이 확인되었다. 3차 조사에서는 담장지를 집중 발굴함과 동시에 팔각건물지 하부의 우물지와 이를 둘러싼 溝狀遺構, 목책 등이 발굴되었다. 또 주변과 담장 하부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초기철기시대 및 삼국시대의 수혈이 확인되었다. 나정과 관련된 시설은 우물지, 원형건물지, 팔각건물지, 1열의 석열과 적심 등인데 이들 시설은 순서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우물지는 팔각건물지의 남동쪽 하층에서 조사되었는데 주변에 기둥구멍이 있고 외곽에는 구상유구와 목책시설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물지의 평면 형태는 타원형으로 길이 4.3m, 너비 2.5m, 깊이 1.7m 정도이다. 바닥 중앙부에서 지름 1.5m의 원형 우물이 확인되었는데 바닥에는 강돌이 정연하게 깔려 있었다. 상부에는 우물을 복토할 때 사용된 판석이 1장 덮여 있었으며, 우물의 북쪽에 이곳으로 내려오기 위한 너비 40cm 정도의 통로가 경사지게 마련되어 있었다.
우물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둥구멍은 평면 원형의 형태로 상부에 우물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우물지 외곽으로 5m 떨어진 지점에 너비 2m, 깊이 최고 1.5m 정도의 원형 溝가 돌아가는데 그 남동쪽 일부가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있어 그곳이 출입시설로 판단된다. 후에 구상유구를 복토한 후 만들어진 원형건물지는 현재 일부 초석과 적심석이 남아 있다. 이는 기존 우물지를 중심으로 초석을 사용한 건물지를 세웠던 것으로 보이지만, 파괴가 심해 세부적인 성격을 알 수 없다.
팔각건물지는 우물지를 복토한 후 약간 북쪽으로 이동하여 축조된 것으로, 한 변이 8m 내외이고 동서·남북 길이가 각 20m이다. 내부에는 크기 20cm 정도의 강돌을 사용해 4.5m 간격으로 4개의 적심을 배치하였다. 중앙에는 수혈이 있는데 보고자는 기존 우물지를 복토하면서 그 상징적 기능을 대체할 목적으로 조성되었을 것이라고 보았으나 중심 기둥구멍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남쪽 중앙부에는 길이 14m, 너비 2.3m 내외의 보도시설과 이와 연접하여 계단지로 추정되는 석열이 확인되었다. 팔각건물지의 주변에는 담장이 있고 담장지를 따라 안팎으로 배수로가 확인된다.
이 건물지의 축조연대를 밝힐 만한 직접적인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다만 복토된 우물지에서 목재와 명문기와가 나와 이를 통해 대략적인 건립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수습된 목재의 방사성 탄소연대측정 결과는 480~630년으로 늦어도 7세기 중엽에는 우물지가 폐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儀鳳四年皆土’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를 통해 문무왕 19년(679)에 우물이 복토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나정의 수혈유구와 우물지, 팔각건물지 등은 이곳이 신라의 신성한 장소로서 제사가 거행되던 곳이었음을 알려준다. 특히 우물지 남쪽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수혈유구에서 두형토기편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제사용 토기이므로 이곳에서 일찍부터 제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 나정 유적의 북서모서리에는 삼국시대의 수혈 6기가 분포하고 있다. 평면은 말각장방형 또는 원형으로 내부에서는 고배, 장경호, 개배, 원통형토기, 완, 토제구슬, 방추차, 어망추, 원반형 토제품, 토우편, 수정 등이 출토되었다. 이 역시 제사와 관련된 유구와 유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정은 유적 전체가 제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팔각형 건물은 신성한 장소에 독특하고 웅장한 건물로 축조됨으로써 독립성과 신성성, 상징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이 발굴결과를 ?삼국사기? 소지마립간 9년조의 奈乙이라는 지명과 연관시켜 이 나정의 팔각건물지를 신궁으로 보고 이곳에 시조신이 모셔졌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 듯하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신궁의 주신이 시조신이었다고 섣불리 결론 내릴 수는 없다. 팔각형 건물은 건축형식상으로 종묘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신궁의 주신은 천지신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궁의 주신을 시조신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한국 고대국가의 제사는 天神, 始祖神, 地神에 대한 제사가 그 기본을 이루고 있었다. 천신에 대한 제사는 계급사회의 출현과 함께 나타나며 지배자가 그 지배권의 정당성과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국가단계로 넘어가면서 시조묘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진다. 하늘(天)의 자손임을 강조하기 위해 天孫인 시조에 대한 제사를 지내 배타적 지배권을 확립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하늘과 시조묘에 대한 제사는 초기국가 단계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지역의 세력을 완전하게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地神에 대한 제사권도 장악해 나갔다. 따라서 천신에 대한 제사는 수장사회 단계이며, 천신과 시조묘에 대한 제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초기국가 단계, 천신과 시조신, 지신에 대한 제사권을 모두 장악하게 될 때 정복국가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면에서 ?삼국지? 한전에 나타난 소국과 대국을 발전단계가 다른 것으로 파악하여 소국은 Chiefdom 단계로, 대국은 이미 초기국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구수에 있어서 대국과 소국은 만 여 가, 수 천 가, 수 백 가 등 10여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천신, 시조신, 지신에 대한 제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발전단계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 가능하다. 따라서 신라는 신궁이 설치되어 제도로서 정착된 소지왕대~지증왕대에 정복국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
신라는 토착신앙을 기반으로 사상적 통일을 꾀하였으므로 불교의 수용과 공인에 있어 심한 대립과 갈등이 벌어졌다. 신라는 불교수용 과정에서 자기문화의 체질 위에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무·불 융화의 양상을 보였으며, 결국 독특한 신라불교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본 기고문은 지난 3월 14일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나의뿌리 > 신라 박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혁거세 집단의 남하과정 (서라벌-서울-경주) (0) | 2013.07.11 |
|---|---|
| 신라박씨 역대왕 (0) | 2010.04.03 |
| 시조대왕 탄강 사실 (0) | 2010.04.03 |
| 신라 제 7대 일성왕 (0) | 2009.06.15 |
| 신라 제 8대 아달라왕 (0) | 2009.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