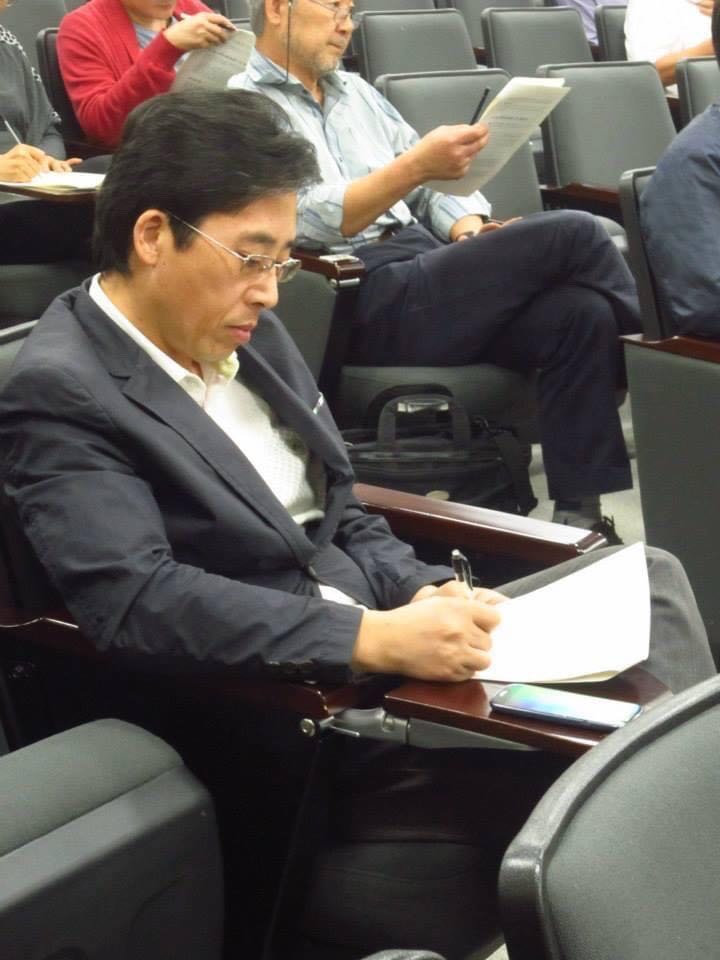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 꿈의동산 놀이공원
- 가평군
- 꿈의동산
- 당일치기여행
- 숭덕전참봉
- 6K2CPV
- 가평꿈의동산
- 숭덕전제례무형문화재
- 가평 가볼만한 곳
- 에덴벚꽃길
- 가평 꿈의동산
- 박씨시조대왕
- #가평여행
- 밀성박씨
- 가평당일치기
- 6K2ELK
- 6K2CPL
- 산책길
- 청평면
- 신라시조대왕
- 6K2CRE
- #가평군
- 남도여행
- #상천리
- 여행스케치
- 6K0IK
- 가평여행
- 6K2BDP
- 6K2FDD
- CQ쟁이
- Today
- Total
cq쟁이
택당선생 별집(澤堂先生別集) 제7권 박 도사(朴都事)의 묘갈명 병서 본문
광해(光海) 말년에 간신(奸臣)이 무뢰배를 유인하여 모후(母后 인목대비(仁穆大妃)를 말함)를 폐위시키도록 청하게 하고는, 이를 일컬어 대론(大論)과 관련된 유소(儒疏)라 하였다. 이렇게 되자 흉악한 무리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 열 명씩 혹은 백 명씩 떼를 지어 다니면서 문득 술자리를 마련해 내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주ㆍ현(州縣)에까지 가서 행패를 부리곤 하였는데, 그럴 때면 수재(守宰)들이 겁에 질린 나머지 행여 남보다 뒤질세라 그들을 환영하고 전송하느라 법석을 떨곤 하였다.
그런데 당시에 함평 현감(咸平縣監)으로 있던 박공 정원 계선(朴公鼎元季善)만은 홀로 문을 닫고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고을 향교의 제생(諸生)들에게도 절대로 그들을 상대하여 어울리지 말도록 엄히 단속을 하였다. 이에 그 무리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으름장을 놓다가 끝내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자, 이웃 고을로 옮겨 가서는 소장(疏章)을 만들어 봉해 부치면서, 군이 대론을 가로막고서 반대하였다고 하소연을 하였다.
그러자 양사(兩司)가 역적을 비호했다는 죄목으로 군을 탄핵하여 사판(仕版)에서 그 이름을 삭제해 버리도록 하였는데, 당시 사론(士論)은 모두 군의 행동을 통쾌하게 여기면서 축출당한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겨 주었다.
금상(今上)이 새로운 정사를 펼치게 되자, 그동안 정도(正道)를 견지하다가 죄를 얻은 사람들이 차례로 현직(顯職)에 서용(敍用)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군에게만은 유독 이러한 은택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군 역시 자신의 입으로 예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외방의 관원으로 응체(凝滯)되어 있다가 그만 또 불행히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늘 군이 그토록 드높은 절조(節操)를 수립하였는데도 그 전이나 그 뒤나 모두 이토록 불우하기만 하였던 것을 탄식하곤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군의 자취가 깜깜하게 묻혀 버린 채 후세에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한 나머지, 이렇게 대략적이나마 군의 행적을 기록하여 묘갈에 새기게 하였다.
박씨(朴氏)는 본래 밀양인(密陽人)이다. 10대조인 박윤문(朴允文)은 고려조에서 보문각 대제학(寶文閣大提學)을 역임하였으며, 아조(我朝)에 들어와서는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박갱(朴賡)이 공주에게 장가들어 귀하게 된 뒤에 죽어서 여강(驪江) 북쪽 언덕에 묻혔는데, 그때부터 자손들이 여기에 집을 짓고 모여서 살게 되었다.
이조 참의에 추증된 휘(諱) 경(經)과, 공조 참판에 추증된 휘 순령(舜齡)과, 창락 찰방(昌樂察訪)으로 좌승지에 추증된 휘 관(寬)과, 이조 참판에 추증된 휘 문충(文沖)이 바로 군의 고조요 증조요 조부요 부친이다. 그리고 군의 백씨(伯氏)인 박진원(朴震元)은 관직이 대사헌에까지 이르러 당시에 이름이 잘 알려져 있었다.
군은 어려서부터 단정하고 수려하였으며,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함께 어울려서 장난을 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는 자들마다 군이 훌륭한 자제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다.
군은 과거 공부를 하였으나 오래도록 성취하지 못하다가, 기유년(1609, 광해군 1)의 진사시(進士試)에 입격(入格)하고는, 곧장 벼슬길에 나아가 목릉(穆陵)과 경기전(慶基殿)의 참봉(參奉)을 역임하고 다시 선공감(繕工監)과 광흥창(廣興倉)의 봉사(奉事)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병진년(1616, 광해군 8)의 문과(文科)에 등제(登第)하여,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로 선발된 뒤에 천거를 받고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가 되었는데, 단계적으로 차서에 따라 다음 관직으로 진출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청현직(淸顯職)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오로지 어버이 봉양에만 뜻을 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으로 승진되고 나서 함평(咸平)의 수재(守宰) 자리를 얻어 외방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한 해가 지난 뒤에 탄핵을 받고 파직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곧장 여강(驪江)의 정사(亭舍)로 돌아와서 대부인(大夫人)을 봉양하는 한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는데, 이러한 일을 마치 죽을 때까지 계속할 듯이 하였다.
이때 마침 허균(許筠)이 반역을 모의한 사실이 발각되어 복주(伏誅)되고 이와 함께 소장을 올린 유자(儒者)들도 많이 죽으면서 당화(黨禍)가 조금 가라앉자, 군이 다시 서용되어 전적으로 복귀하고 선전관을 겸하게 되었다. 얼마 뒤에 대부인의 상을 당했으며, 임술년(1622, 광해군 14)에 상복을 벗은 뒤 흥양 현감(興陽縣監)에 임명되었는데, 어떤 일과 관련되어 파직되었다.
역적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키자, 전라도 방백(方伯)이 군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다. 이에 병력 3000을 이끌고 절도사(節度使)와 함께 먼저 한강변에 도착해서 대가(大駕)를 맞아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때 호조 정랑에 임명되면서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을 겸하였으며, 다시 경차관(敬差官)으로 영남에 내려가 곡물 운송을 독려하였다.
을축년(1625, 인조 3)에 평안 도사(平安都事)에 임명되었다가, 이듬해인 병인년에 직질(職秩)이 차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풍기 군수(豐基郡守)에 제수되었는데, 명이 미처 내려오기도 전인 8월 16일에 갑자기 병에 걸려 일어나지 못했으니, 그때 군의 나이 53세였다.
군은 집에 있을 적에 효성과 우애가 독실하였다. 편모(偏母)를 받들어 모시면서 팔순의 고령(高齡)이 될 때까지 아침저녁으로 음식 맛을 먼저 맛보고서 맛좋은 반찬으로 바꿔 드리는 일을 조금이라도 게을리 한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상(喪)을 당해서는 건강을 해칠 정도로 슬퍼한 나머지 거의 일어나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형장(兄長)을 공손히 모시고 서제(庶弟)를 보살펴 주며 목숨을 마칠 때까지 함께 거처하였다.
관청에서는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남몰래 이루어지는 간사한 일도 곧잘 적발해 내는 등, 마치 옛날의 유능한 관리를 연상케 하는 점이 있었다. 장수를 보좌하고 사명(使命)을 받들었을 때에도 백성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면서 일 역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으므로, 상하가 모두 칭찬하였다. 특히 함평(咸平)에 있을 적에는 더욱 독실하게 백성을 사랑하였으므로, 군이 떠난 뒤에 백성들이 빗돌에 새겨 아름다운 정사를 칭송하였는데, 그 가운데에 “두 해 동안 펼친 덕스러운 그 정사여, 만고토록 맑은 바람 일으키리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니, 그 대략적인 것을 상상할 수 있다 하겠다.
군의 선부인(先夫人)인 용인 이씨(龍仁李氏)는 가평 군수(加平郡守) 이종운(李從運)의 딸로,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은 신후원(辛後元)에게 출가하였다. 후부인(後夫人) 안동 권씨(安東權氏)는 군수 권주(權澍)의 딸이요 갑자년의 직신(直臣) 권달수(權達手)의 후손으로서, 부녀자로서의 도덕 규범을 갖추었는데, 2남 1녀를 낳았으니, 아들의 이름은 박만영(朴萬榮)과 박천영(朴千榮)이고, 딸은 부사(府使) 윤계(尹棨)에게 출가하였다. 박만영은 2남 2녀를 낳았고, 박천영은 1남 1녀를 낳았는데, 모두 어리다. 신후원의 아들은 신익경(辛益慶)이고, 딸은 이신하(李紳夏)에게 출가하였으며, 나머지는 어리다. 군의 묘소는 등신향(登神鄕) 가림리(嘉林里) 병향(丙向)의 언덕에 있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효성과 우애 지극하고 재질을 또 갖췄으니 / 孝友而材
정사에 참여한들 무슨 어려움 있었을까 / 從政何有
혼탁한 그 시대에 불우하기만 하였나니 / 不遇昏濁
평소에 지킨 그 절조를 누가 알아주었으랴 / 焉識素守
뜻 한번 못 펴 본 채 암울하게 보낸 세월 / 闇而不伸
누가 과연 그 허물에 책임을 질꼬 / 誰執其咎
태사가 이렇게 묘갈명을 지었나니 / 太史揭銘
백세 후에까지 전해짐이 있으리라 / 百世在後
[주D-001]갑자년의 직신(直臣) 권달수(權達手) : 연산군(燕山君) 10년(1504)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던 초기에, 권달수는 연산군의 생모 윤씨(尹氏)를 종묘에 모시는 일의 부당함을 직간(直諫)하다가 용궁(龍宮)에 장배(杖配)된 뒤, 다시 그해 11월 의금부로 압송되어 국문(鞫問)을 받던 도중 옥사(獄死)하였다.
[주D-002]누가 …… 질꼬 : 《시경(詩經)》 소아(小雅) 소민(小旻)에, “말을 내놓는 자 뜰에 가득하다마는, 누가 감히 그 허물에 책임을 질꼬.[發言盈庭 誰敢執其咎]”라는 말이 있다.
'나의뿌리 > 동호공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랑 증참판 조직 묘지명 병서 (0) | 2022.06.04 |
|---|---|
| 밀성박씨 충헌공파 후 군수 박태원 만사 (0) | 2022.03.03 |
| 밀성박씨 충헌공파 후 동호공 박정원 행장 (0) | 2022.01.10 |
| 함평 기성가 (0) | 2013.07.08 |
| 기산사록 (0) | 2013.07.07 |